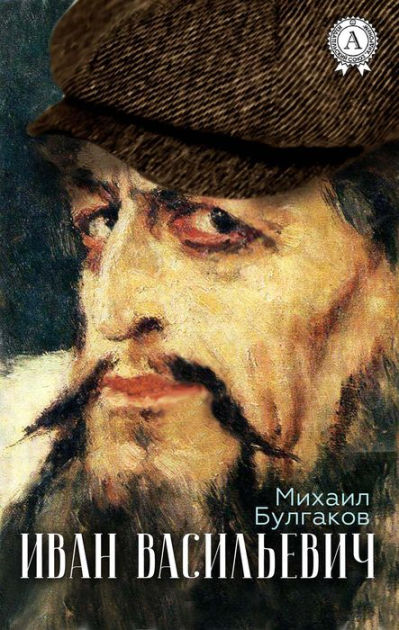
<책 소개>
'이반 바실리예비치'는 러시아의 뛰어난 작가이자 극작가인 미하일 불가코프의 희곡이다. 줄거리는 엔지니어인 티모페예프가 발명한 기계의 고장으로 모스크바의 아파트 관리인 분샤와 사기꾼 조르주 밀로슬랍스키가 16세기로 이동하고, 차르 이반 뇌제는 20세기에 오게 되는 시간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 희극은 레오니드 가이다이의 영화 '이반 바실리예비치 직업을 바꾸다'의 원작이 되었으며, 영화에서는 배경이 1970년대로 옮겨졌다. 작가의 다른 유명한 작품으로는 '백위대', '거장과 마르가리타', '개의 심장', '연극 소설', '수갑에 대한 메모', '치명적인 알', '젊은 의사의 메모', '악마의 연극 ' 등이 있다. (출처: Goodreads)
불가코프의 희곡 「이반 바실리예비치」(Иван Васильевич, 1936)는 발명가 티모페예프가 만들어 낸 타임머신으로 인해 벌어진 소동을 그린 희극이다. 서로 다른 시기를 살고 있던 이반 바실리예비치들─고대 모스크바의 이반 뇌제와 소련의 아파트 관리소장 분샤─은 티모페예프의 타임머신을 통해 서로의 시대로 가게 된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이름뿐만 아니라 외모도 똑같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각자의 시대로 되돌아오지만, 성난 이반 뇌제가 타임머신을 때려 부수며 연극은 막을 내린다.
공간과 시간의 경계
시간여행이라는 모티프는 본질적으로 경계적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반 바실리예비치」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좀 더 카니발적으로 나타나는데, 단순히 경계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그것이 전도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제1막에서 처음으로 타임머신이 작동하는 장면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티모페예프가 처음 타임머신을 작동하자 집의 벽이 사라진다. 티모페예프를 소비에트라는 새 시대가 탄생시킨 새로운 인간상으로, 옆집 쉬파크를 당대의 평범한 인간상으로 대치해보면 벽이 사라지는 것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경계의 붕괴와 전도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현대로 온 이반 뇌제는 고대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며, 이는 고대로 간 분샤와 밀로슬랍스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행동은 각각의 막 내에서 고도로 희극적인 진행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이야기를 카니발적으로 구성해내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카니발로 구성될 수 있게 된다.

변복과 참칭의 모티프
가짜 왕의 대관과 탈관은 카니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작중에서 이러한 요소는 밀로슬랍스키를 통해 잘 드러난다. 그가 처음으로 참칭하는 대상은 쉬파크이다. 도둑인 그는 쉬파크 집의 자물쇠를 따고, 옷장을 부숴 쉬파크의 양복을 입고 시계를 찬다. 분샤에게 덜미를 잡히자, 그는 쉬파크의 친구를 사칭한다.
분샤와 함께 고대 모스크바로 떨어진 이후 그는 분샤를 이반 뇌제로 참칭시킴으로써 위기를 벗어난다. 비록 황제로 분한 것은 분샤이지만, 실질적인 황제 노릇을 하는 것은 밀로슬랍스키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발휘한 그의 기지 덕분에 분샤의 차르 참칭은 들통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도둑으로서 본성은 버리지 못하고, 스웨덴 대사와 총주교의 목걸이를 훔친다.
이처럼 분샤와 밀로슬랍스키가 꾸미는 제3막은 자리에 걸맞지 않는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된 상황에 대한 풍자로 이해할 수 있다. 분샤가 차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타임머신을 만든 티모페예프와 같은 아파트에 있었기 때문이며, 밀로슬랍스키는 하필 분샤와 마주쳤기 때문에 고대로 날아가게 되었다. 이는 작가의 다른 소설 『치명적인 알』(Роковые яйца, 1925)에서 자격 없이 국영농장의 책임비서가 되어 온 소비에트를 혼돈에 빠트렸던 ‘록크’를 떠올리게 한다.

시간의 혼란, 혼란의 시기
서로의 역할을 하게 된 이반 뇌제와 분샤는 쉽사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반 뇌제는 현대에 와서도 끝까지 황제 행세를 하고, 분샤는 밀로슬랍스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참칭이 발각되고 만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히 희극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시대를 초월한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혼란으로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다. 비판적 풍자 작품으로서 「이반 바실리예비치」의 방점은 이곳에 찍힌다.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불가코프의 걱정과 조롱은 작가의 다른 소설인 『개의 심장』(Собачье сердце, 1925)과 『치명적인 알』에서 잘 나타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SF라는 장르를 공유한다. 「이반 바실리예비치」가 앞의 다른 두 작품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혁명가의 상에 대한 것이다. 『개의 심장』의 필립과 쉬본제르, 『치명적인 알』에서 록크는 각자만의 동기에 의해 움직이며, 그들에 대한 작가의 시각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시각이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반 바실리예비치」의 티모페예프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기계를 훨씬 더 중요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겪은 소동을 "하찮은 것들"이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불행은 필요하기도" 하다며 분샤에게 폭언을 퍼붓는다. 「이반 바실리예비치」가 앞의 두 작품에 비해 10여 년 후 공개된 작품임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당대 소비에트 사회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불가코프는 티모페예프를 통해 당대 소비에트에 만연한 '인간 개조'의 위험성과 한계를 노골적으로 풍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lettered
'인문사회 >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러시아 문학] 불가코프의 「질주」에 나타난 꿈과 경계 (1) | 2024.02.26 |
|---|---|
| [러시아 문학] 체호프의 작품 세계: 작가는 재판관이 아니다 (0) | 2024.01.14 |
| [러시아 문학] 불가코프의 『개의 심장』에 나타난 반인(half-man) 모티프의 특징 (0) | 2023.08.22 |
| [독일 문학] 베르톨트 브레히트, 「노동자가 의사에게 하는 말」 (0) | 2023.07.03 |




댓글